[칼럼] 모연화와 황은경 약사 그리고 안티푸라민
- 조광연
- 2015-08-06 12:1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어릴 때 제일 힘겨웠던 것 중 하나는 약 먹는 일이었다. 고열 감기에 자주 걸려 끙끙 앓았는데, 거북등처럼 거친 손을 이마에 얹으셨던 아버지가 슬그머니 사라지고 나면 눈 앞엔 꼭 쌍화탕이 놓여 있었다. 뚜둑, 이내 뚜껑을 따선 "꿀꺽 마셔, 어서, 입떼지 말고, 단번에." 아버지 기대에 부응하려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애썼지만, 그때마다 거의 다마셨던 약을 토해냈다. 다 마시려나 기대했던 아버지는 화가 나 "못난 놈"이라며 이마를 쥐어 박았다. 아버지는 매번 쌍화탕을 사오셨다. 참 야속했다. 이젠 토하지 않을 자신이 있지만, 쌍화차도 안 마신다. 보기만해도 참기 힘들었던 그 기묘했던 향과 맛들이 전자기기 회로처럼 일순간 머릿속에 그려지기 때문이다.
뛰어다니다 엎어져 무릎이나 팔꿈치 부분을 흙바닥에 갈아버리는 날도 드물지 않았다. 찰과상이다. 다른 집 아이들은 소위 '빨간 약'을 발랐지만, '유한양행'에 대한 믿음이 크셨던 아버지는 혈장과 피가 스며나는 상처에 안티푸라민에이를 발라주셨다. 왠지 모르겠지만 꼭 '유한냐넹'이라고 발음했던 아버지는 "덧나지 않는데는 이게 제일이다"며 마무리했다. 따금거리고 화끈거려 입을 무릎 쪽에 가까이 대 후후 불어대고 그것도 모자라 책받침을 부채삼아 마구 흔들어 대며 팔팔 뛰었지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일까. 난 좀 친절한 아버지가 됐다. 아이가 발작적으로 재채기를 할 때 항히스타민제를 건네주며 이런 저런 이야기까지 들려주니까. 똑똑한 엄마들을 위한 착한 약 사용설명서라는 부제가 붙은 '우리 아이약, 제대로 알고 먹이나요?(쌤엔파커스, 모연화 지음'를 내비게이션 삼아 말이다.
스마트폰 검색기능도 있고, 약을 좀 아는 듯 해도 막상 소비자 입장에선 약은 늘 어렵다. 의약품을 훤히 아는 약사 눈엔 별것 아닐 수 있는 게 소비자들에겐 이 모양, 저 모양 궁금할 뿐이다. "약이 너무 센것 같아요" "부작용이 걱정돼 못 먹이겠어요" "병원에서 항생제를 너무 많이 줘요. 다 먹여야 하나요" "수입 영양제가 더 좋지 않나요?" 모연화 약사는 매우 단편적 정보에 기대 복약에 흔들리는 아이 엄마들을 위해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과 약사의 전문지식'으로 책을 썼다고 말한다. 그래서 일까. 모 약사는 엄마들의 궁금증을 기막히게 잘도 포착해 설명한다. 약 포장에 적힌 글자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친절하게 소개하는가 하면, 어린이들이 자주 접할 수 밖에 없는 의약품들을 쉬 풀어 보여준다. 게중 백미는 '좋은 대학보내려면?'이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이런 저런 소문같은 약에 관한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죄다 찾아냈다는 점이다. 해서 집안 약 서랍장에 이 책을 보관한다.
모연화 약사의 책이 엄마들, 다시말해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기 위한 것이라면 황은경 약사의 책 '따라만 하면 달인이되는 황은경 약사의 나의 복약지도 노트(도서출판 정다와)'는 초보약사부터 베테랑약사까지를 겨냥한 복약지도 실전 노하우다. 약사들의 효율적인 약국업무에 초점이 맞춰진 듯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책은 그동안 만나 보았던, 소비자들의 궁금증에 최적화된 대답을 제시한다. 약사 독자가 목적성을 갖고 읽는다면 두 책의 목적지는 한 곳이다. 소비자는 궁금증을 어떻게 말하는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환자별 복약지도 편은 약사라면 일독이 필요할 것같다. 소비자인 필자가 보아도, 내 마음이 들킨것처럼 일치한다. "약사님 하나 물어봅시다"라고 시작하는 어르신들의 궁금증들은 약사 입장에선 가슴을 치고 싶을 만큼 답답할 것이다. 딱히 답변하기 만만치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해서 이 책도 약장 서랍에 넣어 두었다.
여름휴가를 맞아 한 여름밤의 꿈, 오이디푸스 왕, 네루다의 우편배달부처럼 부들부들한 책을 읽다가, 아이에게 항히스타민제를 찾아 주는 과정에서 두 책을 다시 만났다. 들여다보니 실용서도 참 재미있었다. 기상천외한 질문들이 난무하는 약국 환경에 있는 약사들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을지 모른다. 한데, 이 책들은 어떻게 내 곁으로 왔을까? 가만보니 증정본이었다. 불현듯 저자들 계좌에 책값을 송금하고 싶어졌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테지만 말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2메디카코리아, 1500억 목표 초과…5년뒤 3000억 도전
- 3다산제약 듀오스탑캡슐 표시기재 불량 자진 회수
- 4동아ST, DOU와 AI 솔루션 업무협약 체결
- 5광주시약 "감기약 등 일반약도 주의"...복약지도 강화 당부
- 6"조언 필요한 신입 약사 모여라"...삼육약대, 동문강좌 개최
- 7구로구약, 초도이사회서 위원회별 사업·예산안 의결
- 8제34대 치과의사협회장에 김민겸 후보 당선...95표차 신승
- 932개 의대, 정원 10% '지역의사' 선발…10년 의무복무
- 10의협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 환영…의대 정상화 출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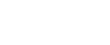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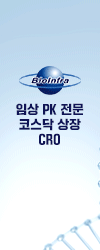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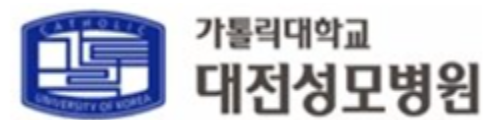



































![[리쥬올]레티노 멜라세럼 저자극 레티놀](https://cdn.platpharm.co.kr/2025/09/2509260219360000145.webp)
![[SK케미칼] 트라스트패취 피록시캄 성분](https://cdn.platpharm.co.kr/2025/10/2510020656150002375.webp)
![[신신] 아렉스 두번효과로 강력한](https://cdn.platpharm.co.kr/2025/10/2510230254510000664.webp)
![[유한양행] 콘택콜드 걸렸구나 생각되면](https://cdn.platpharm.co.kr/2025/10/2510282252420008436.webp)
![[SK케미칼] 속편한정 복합소화제](https://cdn.platpharm.co.kr/2025/12/2512040916400005920.webp)
![[신신] 새사래 상처연고 습윤밴드](https://cdn.platpharm.co.kr/2025/10/2510210339570001784.webp)

![[더본메디칼] ATC인쇄리본 특가](https://cdn.platpharm.co.kr/2025/04/2504100527360001454.jpg)
![[리쥬올]리쥬올 PDRN 약국 1위 PDRN](https://cdn.platpharm.co.kr/2025/09/2509260220180000170.webp)
![[셀로맥스] 베베락스 온가족 안심 관장약](https://cdn.platpharm.co.kr/2025/09/2509171131320018843.webp)
![[종근당] 벤포벨에스 어른들의 피로회복제](https://cdn.platpharm.co.kr/2025/07/2507290841210004645.webp)
![[유한양행] 미녹펜겔 탈모스팟 집중케어](https://cdn.platpharm.co.kr/2025/09/2509220824180004563.webp)
![[한독] 붙이는 통증 전문가, 케토톱 액티브 플라스타(쿨) 40매](https://i.baropharm.com/products/202503/1741829602305.png)
![[레킷코리아] 목 아플 때, 스트렙실 허니&레몬 트로키 12정](https://i.baropharm.com/products/202502/1739520767049.png?label=PLAN_01)
![[켄뷰] 오리지널 폼타입, 로게인5%폼에어로졸60g](https://i.baropharm.com/products/dc84d96e-d0b4-46bc-bcc8-d62016406fe4.png)
![[아워팜] 건강한 힘, 바로바이오틱스 kids 비피더스 50억](https://i.baropharm.com/products/202602/1770888420842.png)
![[휴온스 ] 비듬을 한번에, 니조랄 2%액](https://i.baropharm.com/products/478a284d-4361-4b4a-8a00-8bab80f34319.png?label=PLAN_01)
![[아워팜] 에너지 바로 충전, 바로콤](https://i.baropharm.com/products/202512/1764922282624.png)
![[켄뷰] 다양한 통증에, 타이레놀정 500mg 10정](https://i.baropharm.com/products/6c6ea4f4-7ab2-44f2-a165-f062d80f525b.png)
![[아워팜] CJ웰케어, 바이오코어 1000억 유산균](https://i.baropharm.com/products/202512/1765955416559.png)
![[아워팜] 우리아이 맞춤설계, 바로타민 kids 엘더베리맛](https://i.baropharm.com/partner/products/3f39593e-6318-4dd9-a778-c008c868b5c8.png)
![[오펠라] 부드럽고 편안한, 둘코락스에스장용정 20정](https://i.baropharm.com/products/202511/1762260404625.png)
![[아워팜] 아이들이 먼저찾는, 바로타민 kids 미네랄](https://i.baropharm.com/products/202512/1766121243228.png)
![[레비온] PDRN+EGF, 레비온RX PDRN EGF 크림](https://i.baropharm.com/products/202512/176594942660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