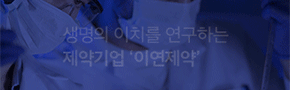[기자의 눈] '코리아 패싱' 기획 취재 에필로그
- 어윤호
- 2019-09-16 06:12: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난달 의약품 코리아 패싱 현상을 다룬 3편의 기사(관련기사 참조)는 유독 취재와 작성에 어려움이 많았다. 제도를 둘러싼 정부와 산업계와 첨예한 입장차는 항시 존재한다지만 '코리아'라는 단어에서 비롯되는 '애국'의 경계가 자칫 밸런스(balance)에 영향을 미칠까하는 우려 탓이었다.
제약업계 역시 조심스럽긴 마찬가지였다. 기사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다국적제약사 대상 설문조사는 20개 업체의 대답을 받아내는데, 한달의 시간이 소모됐다.
아직까지 '신약=다국적사'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약가가 낮아, 이대로는 우리회사가 약을 안 팔 것이다"라는 말은 부담을 준다. 해당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라는 계층을 내려놔야 한다. 단순히 한국법인을 떠나 본사 차원에서 난감함을 표했다는 여담도 있었다.
같은 '익명' 담보라 하더라도, 댓글과는 성격이 다르다. 한 제약회사의 대표성을 지닌 의견은 업계 대표성의 일부가 된다.
A7을 A10으로 바꾸고 ICER값 상향, 제도의 근본적인 조정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비공개 약가 비중을 높이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을 보더라도, 정도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들이 엿보인다.
"자국민 건강을 위해 이기적일 필요가 있다"는 한 다국적사 약가담당자의 말은 진심을 담고 있었다. 재정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닌데, 비공개 약가 문제에 선비처럼만 접근할 수는 없다. 참조하기 좋지만 시장이 작은 우리나라의 딜레마는 짊어져야 할 짐이다. 시민단체 눈치보기는 여전하지만 정부가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확대의 첫발을 뗀 것도 고무적이지만 잔존하는 갈증을 위한, 패싱 최소화를 위한 움직임은 지속돼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바라고 당부하게 되는 것은 '약'이라는 재화에 대한 책임감. 제도개선 과정의 중간에, 본사 설득의 논의 과정에 '우리회사의 약을 우리나라에 가져오는 일'을 하는 이들에게 수반됐으면 하는 가치이다.
"약이 잖아요. 벤츠 자동차가 아니라, 샤넬 가방이 아니라 약이 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씁쓸해요."
기사에 나왔던 문구는 정부 측의 코멘트가 아닌, 어느 다국적사 약가 담당자의 고백이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원 인하 품목 수두룩"…약가인하 리스트 보니 '한숨만'
- 2다케다, 보신티 재허가…종근당, TZD+SGLT2 승인
- 3대체조제 통보 시스템, 전담조직 구축...내년 1월 임시오픈
- 4알지노믹스 '따따블' 뒤엔 확약 방패…해제 땐 양날의 검
- 5케이캡, 물질특허 방어...제네릭, 펠루비·듀카브 분쟁 승전보
- 6"마트형약국도 위협적"...도넘은 판촉에 약사들 부글부글
- 7트루셋 재심사 만료에 본격 경쟁...후발약 '로디엔셋' 등재
- 8삼성바이오, 미 공장 4천억에 인수...첫 해외 거점 확보
- 94천품목 약가인하에도 수급불안 3개 품목은 약가가산
- 10유나이티드, 영리한 자사주 활용법…2세 지배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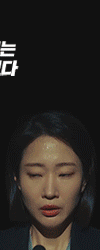













![[리쥬올]리쥬올 PDRN 약국 1위 PDRN](https://cdn.platpharm.co.kr/2025/09/2509260220180000170.webp)
![[리쥬올]레티노 멜라세럼 저자극 레티놀](https://cdn.platpharm.co.kr/2025/09/2509260219360000145.webp)
![[SK케미칼] 트라스트패취 피록시캄 성분](https://cdn.platpharm.co.kr/2025/10/2510020656150002375.webp)
![[유한양행] 콘택콜드 걸렸구나 생각되면](https://cdn.platpharm.co.kr/2025/10/2510282252420008436.webp)
![[유한양행] 미녹펜겔 탈모스팟 집중케어](https://cdn.platpharm.co.kr/2025/09/2509220824180004563.webp)
![[종근당] 벤포벨에스 어른들의 피로회복제](https://cdn.platpharm.co.kr/2025/07/2507290841210004645.webp)
![[위고비] 주1회 GLP-1 RA 비만치료제](https://cdn.platpharm.co.kr/2025/12/2512020211090000013.webp)
![[신신] 아렉스 두번효과로 강력한](https://cdn.platpharm.co.kr/2025/10/2510230254510000664.webp)
![[신신] 새사래 상처연고 습윤밴드](https://cdn.platpharm.co.kr/2025/10/2510210339570001784.webp)
![[SK케미칼] 속편한정 복합소화제](https://cdn.platpharm.co.kr/2025/12/2512040916400005920.webp)
![[더본메디칼] ATC인쇄리본 특가](https://cdn.platpharm.co.kr/2025/04/2504100527360001454.jpg)
![[셀로맥스] 베베락스 온가족 안심 관장약](https://cdn.platpharm.co.kr/2025/09/2509171131320018843.webp)